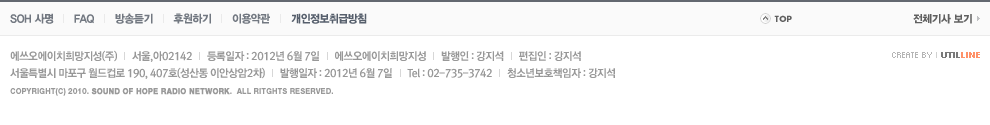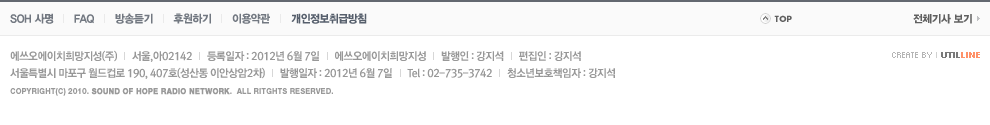중국 언론은 어떻게 길들여지는가
[미디어오늘 2006-01-22 00:00]
[미디어오늘] 기자인 중국 친구를 만났다. 만나자 마자 그가 꺼낸 대화의 ‘화두’는 황우석 사건이다. “사기를 쳐도 세계적인 특종감으로 사기를 쳤으니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한국인의 일그러진 민족 영웅 아냐?” 남의 아픈 곳을 찌르듯 그 친구는 시종일관 황우석 사건을 안주삼아 대화를 이끌어 갔다. 그런데 그 ‘씹는 재미’가 시들해질 무렵, 그가 다소 ‘재미 없는’ 표정이 되어 신세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그래도 난 한국이 부러워. 중국에서 황우석 사건이 났더라면 절대로 보도를 못하게 했을 거야. 나라망신이라며…. 만일 ‘위험을 무릅쓰고’ 보도를 했다가는 그 신문사나 기자는 작살이 나고도 남을 걸.”
지방 관리와 유착돼 있는 중국 언론
내친 김에 그는 얼마 전 겪은 일화를 들려 주었다. 한 지방정부 취재를 하던 중에 그 지방 시장의 부패사실을 알고 열심히 취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취재를 마친 후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 신문사로 돌아와 보니 놀랍게도 그 시장이 자기보다 먼저 신문사에 도착해서 편집장을 만나고 있더라는 것. 그 시장이 베이징으로 급히 올라온 까닭은 당연히 자신의 부패 사실이 기사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문사의 고위간부와 그 시장은 ‘콴씨’(關係)가 아주 좋은 사이였다. 기사는 ‘당연히’ 나가지 못했다. 미처 기사를 쓰기도 전에 이미 위에서 ‘모르는 일’로 함구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면서도 꽤나 답답하고 아니꼬웠는지 혹시 그 시장 부패건을 기사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냐고 물어본다.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매체에라도 대신 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다. 문득 3년전 중국 전국인민대표자 대회(전인대)를 취재하던 중 만난 한 중국기자가 떠오른다. 전인대가 열리던 베이징 인민대회당 복도에서 만난 그 신문기자는 당시 처음 만난 나에게 뜬금 없는 제안을 해 왔다. 중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한 유명인사의 부패한 사생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관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언론에서는 그것을 기사화 하는 것이 ‘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취재를 다 하고도 쓰지 못한다는 하소연을 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기자 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베이징의 유력 일간지 ‘신징바오’(新京報) 기자들이 편집장과 부편집장의 갑작스러운 직위 해제에 항의해 중국 언론사상 최초로 파업을 일으켰다. 물론 이 놀랄만한 사건은 중국 내에서는 일절 보도되지 못했다. 신징바오는 지난 2003년 중국 중앙선전부 직속의 지식인들이 보는 관방신문인 ‘광밍르바오’(光明日報)와, 사스 등 사건을 중국언론에서는 최초로 보도하는 등 중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보도를 하는 매체로 유명한 ‘난팡르바오’(南方日報) 가 합작해서 만든 베이징의 신생 일간지다. 경영은 광밍르바오측이 맡고 신문 편집진들은 대부분 난팡르바오측 인사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다른 매체들보다도 훨씬 더 개혁적이고 대담한 보도들을 많이 했다. 다른 신문에서는 감히 다루지 못하는 소재들을 ‘펑펑‘ 터뜨리면서 신생 일간지답지 않게 아주 빠르게 독자층들을 확보해 나갔고 불과 2년 여의 짧은 시간내에 중국내 대표적인 신문으로 떠올랐다. 당연히 ‘위’에서 보기에는 눈엣가시 같은 신문이었다.
개혁적 신징바오지 편집장 해임과 기자 파업
이번 파업사태를 야기시킨 신징바오 편집장과 부편집장의 직위해제 사건은 아주 사소한 실수가 빌미가 되었다. 중국 쟝시(江西)성내 한 현(縣) 현장의 비리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그 현장 사진을 싣는다는 것이 그만 실수로 쟝시성 성장의 사진을 실은 것이다. 그러나 기자들은 그것을 단순 징계차원으로 보지 않고 당국이 의도적으로 신문을 통제하기 위한 ‘작전개시’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곧바로 신문사 근처 카페로 집결해 파업을 도모했다. 하지만 파업은 불과 2∼3일을 넘기지 못했고 현재 신징바오의 편집진은 모두 중앙선전부 소속의 광밍르바오가 ‘접수’했다. 황우석 사건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한국언론이 부럽다고 말하는 기자친구는 이번 신징바오 사태에서도 당국의 ‘길들임’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앞으로는 더 자발적으로 길들여져야겠다는 신소리를 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media@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