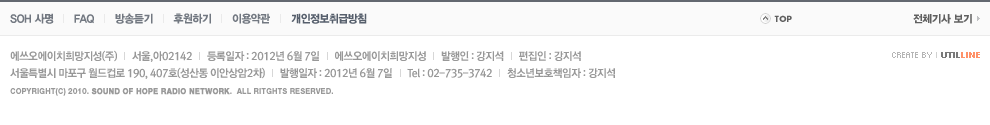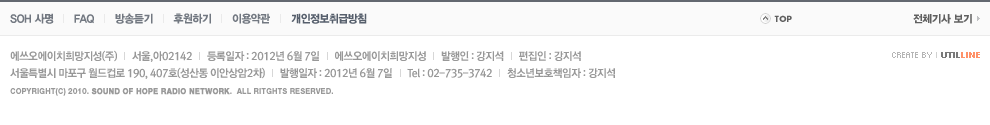경비원이 된 나는 그날도 철거 빌딩 경비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달리 할 일도 없어 경비실에 있는 조그만 TV에서 방영하는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제목은 '8월의 크리스마스.'
이전에도 4~5번 정도 이 영화를 본 기억이 난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영화.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되는데..."
한없이 혼자 뇌까려 보지만 현실은 달라질 게 별로 없다. 가슴이 아프다. 뜨거운 눈물이 나의 볼로 주르륵 흘러 내렸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할머님 생각이 나고 그 눈물은 슬픔을 배가시켰다. 영화가 끝나고 눈물이 메말라 갈 무렵, 밖에서 또박또박 발자국 소리가 났다.
얼른 눈물을 닦고 울지 안은척 자세를 가다듬고 앉았는데 몇일전 옥상에서 만났던 그 소녀가 날 보며 웃고 있는게 아닌가.
난 깜짝 놀라며 "이게 누구야"라며 말을 거넸다. 눈물을 얼른 닦았지만 아직 얼굴에는 눈물자국이 남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 소녀는 미소를 띠었다. 말투도 밝았다.
"그냥 지나가다 왔어요."
순간 그 소녀에게 밥이라도 먹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수가 없었다. 수중에 남은 돈이 달랑 1천5백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소녀는 밝게 웃으며 나에게 먼가를 건넸다.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김,김밥이었다.
"머, 이런걸 주냐. 그래 고마워."
김밥을 건네준 그녀는 "안녕히 계세요"하며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래 잘가, 고마워."
천사같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의 그녀가 순식간에 호감이 갔지만 뒷모습만 멍청히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그녀와 더 긴 대화를 기대했지만 갑자기 가는 통에 아쉽기도 하고 그립기도 했다.
안 그래도 배고픈 차에 김밥이라... 그것도 아직 따뜻한 온기가 가시지 않은 김밥이었다.
모듬김밥...이쁘게도 만든 도시락. 난 그 소녀가 이 도시락을 다시 찾으로 올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며 단숨에 김밥을 먹어 치웠다.
31년 내 인생에 가장 맛있는 김밥이었다. 밥풀하나 남기지 않고 남김없이 해치웠다.
그러나 그녀는 이후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지금도 그 소녀가 생각난다. 아주 많이....
9월이 되도 철거대장은 감감 무소식. 그를 본지 20여일이 지났다.돈은 바닥나고 끼니가 걱정이었다. 생각끝에 건물안에 있는 고물을 하나둘씩 팔기로 했다. 스뎅과 샷시등이 키로그램 당 얼마씩 하는지 대강 알기 때문에 돈이 보였다. 지나가는 고물아저씨를 불러 값이 나갈만한 것을 골라주고 3만원을 챙겼다.
철거대장 형에게는 미안했지만 살기위해 어쩔수 없었다. 몇일은 끼니 걱정 안해도 되니 마음이 좀 안정이 됐다.
이곳은 고양이 천국이다. 세입자들은 모두 나가고 가끔 일보러 몇몇 세입자만이 폐허가 된 자기 업소를 찾는다.
항상 혼자 있다보니 고양이가 내 친구처럼 느껴진다. 이들 수십마리 고양이 왕은 검은 숫고양이다. 덩치가 얼마나 큰지 진짜 웬만한 개만 하다. 그놈만 뜨면 모든 고양이들이 쥐새끼 처럼 도망가기 바쁘다.
어느날은 새끼고양이 울음소리가 지하에서 흘러나와 가봤더니 작은 고양이 한마리가 천정에서 떨어진 듯 어미 고양이를 부르고 있었다.불쌍해서 그놈을 조그만 통에 담아 경비실로 돌아와 풀어줬더니 손살같이 어디론가 숨어들어갔다. 큰 맘 먹고 참치 통조림을 구입해 그놈이 들어간 구멍앞에 뒀더니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나 그녀석을 쓰다듬기까지는 했는데 검은 고양이가 등장했다.
그 놈이 새끼고양이를 해칠까봐 난 왕고양이에게 달려가며 그를 건물에서 쫒아냈다. 그 사이 새끼 고양이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다음날 아침, 난 서늘하게 변한 새끼 고양이 사체를 봤다. 불쌍한 모습으로 죽어간 그놈의 사체를 보니 가슴이 아팠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놈의 왕 고양이가 자기 새끼 아닌 고양이는 보는 즉시 죽이는 것이었다. 일종의 영역표시 행동이었다.
어쩜 고양이 세상도 이 놈의 세상과 꼭 닮았는지.
밤이면 가끔 옥상에 올라간다.형형색색의 레온빛과 고층건물이 한눈에 보여 운치가 상당하다. 시원한 바람이 일순간 마음을 확 트게 하기때문에 옥상에 오르고 나면 마음도 후련해진다.
옥상에서 나는 몇구절 안되는 가사 틀린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수돗물 공급이 안되는 건물 사우나에는 탕에 받아 놓은 물이 상당해 그곳에서 빨래도 하고 세수도 한다.그 탕에는 수백마리의 모기와 날파리들의 사체가 즐비해 바가지로 요령껏 퍼야 한다. 이 물이 바닥나기 직전에야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철거작업이 시작됐다.
새벽 5시에 기상하고 하루종일 철거작업을 했다.그러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경비서는 것 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다.
하루하루 건물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된 것이다.
건물 철거가 끝나고 그 곳을 떠날때 철거대장 형이 나를 조용히 불렀다.
"요즘 어려워서 많이 못준다."
그는 나에게 이해하라며 봉투를 건넸다 .단 그동안 같이 일했던 여러 형들에게 인사하고 그곳을 떠났다.
돌아서는 길에 살짝 봉투를 열어봤다. 세어보니 30만원이었다. 지난 10개월동안 일하고 받는게 고작 30만원. 허탈했다.
돌아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건달이니 어쩌겠는가. 아 힘없고 빽 없는 놈의 슬픔이여.